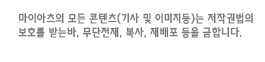- Play Art
- 발굴의 기쁨
- 정혜숙 작가의 작업은 독특하다. 평면에 자기(磁器)를 붙인다. 그것도 깨진 그릇을. 그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다. 그것은 반듯하게 절단되었거나, 파편화된 조각들로 흩어져 평면 위에 놓여있다. 마치 물에 잠긴 채 둥둥 떠다니는 그릇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바람결에 날리는 치마 같기도 하며,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언제라도 튀어나올 듯한 요술램프 같기도 하다. 볼수록 흥미로운 그녀의 작업은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달콤한 ‘노스탤지어(nostalgia)’이다. 어릴 적, 흙장난을 하며 발견했던 유리 조각을 보고 귀여운 상상력을 키워왔던 소녀는 훗날 깨진 그릇을 평면에 옮겨 붙이는 어른이 되었다. 그렇게 땅파기 놀이에서 시작된 유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발굴’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로의 향수를 자극하는 정혜숙의 작품을 통해 흙장난 하던 어린 시절로 시간을 되돌려 지나간 세월에 묻혀 있는 오밀조밀한 기억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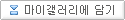
 접기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