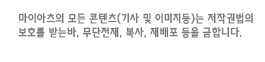- 작품명 :
- 원죄없는 잉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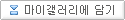
- 작가명 : 박대조, color changing adaptation Transparency in light box 79 x 82cm 2009
 작품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작가노트
-
외양은 끊임없이 편리하고 번듯하고 풍성해지는 반면 내면은 텅 비고 삭막하고 고통스러운 현대인의 삶. 현대인의 정체성과 실존 의문에서 출발한다. 사라지고 생기고 보고 보이고...나는 너와 별개가 아니고 세계는 관계하며 공존한다. 현대인의 존재 물음부터 개인 혹은 사회 부조리에서 비롯된 갈등과 인간욕망에 의해 상처 입은 자연과의 관계모색을 나타내려한다. 음과 양, 흑과 백, 자연이 가진 원초적인 색을 도전의 의미를 가진 돌 위에 인간이 가진 가장 순수한 표정 그리고 자연과의 동화를 표현한다.
미술이란 단순히 미적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에의 찬 사 이전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거나 잃어버린 사실을 일깨워주고 되찾게 해준다. 그 잃어 버린 대상은 과거의 존재 개념으로서의 自然, 즉 현재의 물질문명과는 완전히 차단된 自然 인 것이다. 옛부터 인간이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순응하며 살아왔다. 이른바 우리 고유의 정신문명이라 일컫는 민간신앙? 종교 ?전설 등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숭배사상에서 유래 되었다. 이는 자연을 극복의 대상이 아닌 순응과 조화의 대상으로서 자연이 주는 해택을 누려왔던 것이다. 동양에서 발생한 사상들은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려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노장(老莊)사상의 “무위자연(蕪爲自然)”은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자연과 조화스러운 삶을 영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현시대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오존층파괴, 수질 및 토양 오염등과 같은 말들은 옛 선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자연으로의 회귀와 自然과 인간의 合一된 세계인 천지인합일(天地人合一)적 본능의 바탕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삶은 자기를 둘러싼 주변 조건들과 자기 내부의 깊은 곳으로부터 발생하는 근원적인 의문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해답을 추구하는 힘든 노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 실존의 깊은 의미와 근원적 생의 의미를 확대 심화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그러한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은 고사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린 것 같다. 내게 있어 작품 활동은 자기 내부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자연과의 지속적인 반응과 소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철학인 것이다.
나는 그림을 통해 문필가가 수필이나 일기를 쓰듯 그렇게 화폭에 표현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가슴속에 숨어있는 어떤 것들이 그림을 통해서 스며나와 선을 긋고 색채라는 옷이 붓을 통해 입혀질 때 그리는 동안 만나고 싶은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면 ‘이 그림은 내 마음에 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림들은 나의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한다. 유치하기 그지없다. 지워보고 칠하고, 또 칠하여 캔버스는 여러 겹의 옷을 입고 힘겨워한다. 하지만 끝까지 그려본다. 갈수록 그림의 세계는 끝이 없고 무궁무진함을 느낀다. 또한 그림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 하지만 그림을 그려놓고 부끄러움과 역부족을 느끼면서 순수한 미술은 어떤 욕심만 앞서서는 다가갈 수 없다는 것도 느낀다. 진리는 누군가 발견한다고 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본다. 이것이 무위자연의 이치가 나에게 주는 가르침인 듯하다. 그림을 그리며 나의 존재를 의식하고 싶고 나의 그림 앞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다. 지속적인 새로운 도전과 시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자 운명이라 이름 짓는다.
‘난 자연의 일부다. 나를 넘어선 자연의 무한성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자연의 본성과 흐름을 따를 때 나와 주변, 세상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과의 내밀한 공감을 통해 그림자와 더불어 길을 갈 때 나의 길과 자연의 길은 같다.’
인간의 삶은 시간 속에 존재한다. 제각기 다른 삶은 인간의 개성을 낳고, 그 개성은 창조력의 근원이 된다. 긴 겨울 동안에는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따뜻한 봄을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더운 여름 속에서 시원한 가을을 기다린다. 말하자면 지나치며, 기다리며,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인간의 삶도 이러한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영속적으로 이어진다. 나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루의 가치를 생각하며 그림을 그린다. 이것은 삶의 리얼리티이다. 돌은 이러한 인간의 시간을 자연에 새겨놓은 화석이다. 억겁의 시간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던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조용히 관망하던 돌을 현실 세계로 끌어와서 나를, 인간을 그려 넣는다.
2008년 06월
- 작가 평론
-
1. 아가야 달맞이 가자.
어린아이는 동, 서양의 영원한 철학적, 문학적 영감의 원천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어린이를 우리의 스승으로 부르고 싶다 했으며, 가스통 바슐라르는 어린시절을 향한 몽상은 근본적 이미지들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했다. 불경의 정수인 화엄경에서는 선재동자를 드러내 지혜를 찾아나서는 구도행의 표본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아이의 세계는 철학, 종교, 문학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는 이상계의 모범으로써 은유되고 있다.
박대조가 작업하는 세상의 아이들 또한 어린아이의 동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작가는 어린이에게서 절대적인 미를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노자(老子)는 도(道)의 상태를 무위(無爲)이고 자연(自然)이라 하였는데, 그 도를 보는 마음을 현람(玄覽, 통찰력을 지닌 지각 또는 거울)이라 했다. 그 현람을 노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 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에 합치되는 아이의 본성은 박대조에게 감정이입의 대상으로서 조형화된다. 그의 아이들은 고발적이고 폭로하는 성숙한 아이로써 재탄생되고 있다. 세계의 본질을 관조하는 오묘한 거울로서의 아이의 눈은 인간의 욕망으로 빚어지는 재앙과 공포를 응시한다.
아이의 동공 속에 입혀진 전쟁, 지진, 기아와 같은 인류의 대재앙들은 아이의 웃음, 아름다움, 자연, 생명을 위협하는 문명의 잔인한 폐해들로 드러난다. 사실, 그의 작품은 “동자(童子)란 사람의 처음이고, 동심은 마음의 처음이다. 동심(童心)이란 진심(眞心)인데, 세상이 혼탁한 것은 다욕(多欲)으로 인한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이탁오(李卓吾)의 <<분서(焚書)>>에서 그 철학적 내용과 상응되고 있다. 그 욕망이 불러온 진상을 눈에 넣은 아이들은 현대를 증명하는 아이, 그 실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거울로서의 어린아이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인류가 저질러 온 총체적인 위기와 난관에 관한 증거이자 경고이며, 강한 어조의 고발인 것이다.
티없이 맑고 작은 아이들의 세계는 작가의 화면에서 거침없이 드러난다. 아가야 나오너라의 홍난파의 달맞이 동요가 흐르는 듯하다. 온통 이 세상이 아이들의 웃음과 아이들의 희망으로 가득한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아이는 작가가 희구하는 세계의 본질이며, 이상계를 대표하는 하나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근작들에게 보여주는 염원이나 human & city 시리즈에서는 종교적으로 승화된 아이들과 성스러운 힌두교, 불교의 발원지라 불리는 성산(聖山) 카일리쉬가 있는 히말라야의 자연을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작가가 희구하는 세계의 구체화된 모습들을 찾아 나서고, 이를 화면으로 제시하고 이해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박대조는 이상계의 형상화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가 현상계를 증명하고 이상계의 본질로 드러낸 어린아이들은 정신이 이미 훌쩍 커버린 어른아이들이며, 이들은 고독하고 슬프다. 그가 이상계로써 새롭게 만난 네팔의 아이들조차 그들의 검은 빛 눈동자에는 문명을 관조하는 슬픔과 고독이 들어 있다. 따라서 아이로 은유하는 기쁨과 순수는 욕망과 파괴와 대립되고 있다. 작가의 대립과 화해는 화강암에 사진을 음각하는 작업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돌이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과 같은 영원성과 자연의 대표물이라면, 사진은 영원에 대립하는 순간성과 현대문명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