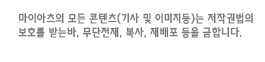- 작품명 :
- The camouflaged rabb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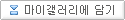
- 작가명 : 김민경, F[1].R.P,fabrics 50 x 70 x 140(h)cm 2005
 작품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작가노트
-
한낮의 오후, 졸음에 겨운 눈꺼풀을 이불 삼고 싶어질 때 저 멀리 토끼가 저벅저벅 걸어온다.
가만 '저벅저벅'이라니,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야 하는게 아닌가! 눈을 번쩍 뜬 당신은 순간 고민에 빠질지 모른다. 이걸 토끼라고 불러야 하나? 사람이라 불러야 하나? 토끼 귀가 삐죽 솟아 나왔지만, 영락없는 사람이다. 정확히는 여자다. 그러나 능청스럽게 당근을 들고 있지를 않나, 두팔과 다리를 쭉 뻗어 요가 자세를 취한다. 과연 이 동물의 정체가 궁금해 질때 작가는 슬그머니 '위장(僞裝)'이라는 단어를 꺼낸다.
작가 김민경은 스스럼없이 자신은 위장하며 살고 있다고 밝힌다. 흡사 토끼처럼 동그란 눈을 갖고 있는 작가는 본래 성격을 감추고 예쁘게 깜찍한 토끼마냥 스스로를 위장한 채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같은 체험은 작가의 상상력을 발동시켜, 현대인의 삶을 위장토끼에 확장시켜 놓았다. 자의든 타의든 자신을 보기 좋게 위자아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장 토끼에 표현한 셈이다. 마치 토끼가 사람으로 위장한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이 토끼로 위장한 것일 수도 있는 위장 토끼의 모호한 어법처럼 말이다. 현대인과 자신의 위장을 정공법으로 말하는 대신 이솝 이야기처럼 우화(寓話)로 이야기하고 있는 작가 김민경의 위장토끼는 '토끼'란 이미지 때문에 바니 걸이란 성적코드로 읽혀지기도 한다. 이에 작가는 사진을 같이 찍어 남기고 싶을 만큼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지만, 위장을 표현한 만큼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음 한다고 말한다.
-미술세계 이미라 기자 2006_
- 작가 평론
-
한낮의 오후, 졸음에 겨운 눈꺼풀을 이불 삼고 싶어질 때 저 멀리 토끼가 저벅저벅 걸어온다.
가만 '저벅저벅'이라니,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야 하는게 아닌가! 눈을 번쩍 뜬 당신은 순간 고민에 빠질지 모른다. 이걸 토끼라고 불러야 하나? 사람이라 불러야 하나? 토끼 귀가 삐죽 솟아 나왔지만, 영락없는 사람이다. 정확히는 여자다. 그러나 능청스럽게 당근을 들고 있지를 않나, 두팔과 다리를 쭉 뻗어 요가 자세를 취한다. 과연 이 동물의 정체가 궁금해 질때 작가는 슬그머니 '위장(僞裝)'이라는 단어를 꺼낸다.
작가 김민경은 스스럼없이 자신은 위장하며 살고 있다고 밝힌다. 흡사 토끼처럼 동그란 눈을 갖고 있는 작가는 본래 성격을 감추고 예쁘게 깜찍한 토끼마냥 스스로를 위장한 채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같은 체험은 작가의 상상력을 발동시켜, 현대인의 삶을 위장토끼에 확장시켜 놓았다. 자의든 타의든 자신을 보기 좋게 위자아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장 토끼에 표현한 셈이다. 마치 토끼가 사람으로 위장한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이 토끼로 위장한 것일 수도 있는 위장 토끼의 모호한 어법처럼 말이다. 현대인과 자신의 위장을 정공법으로 말하는 대신 이솝 이야기처럼 우화(寓話)로 이야기하고 있는 작가 김민경의 위장토끼는 '토끼'란 이미지 때문에 바니 걸이란 성적코드로 읽혀지기도 한다. 이에 작가는 사진을 같이 찍어 남기고 싶을 만큼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지만, 위장을 표현한 만큼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음 한다고 말한다.
-미술세계 이미라 기자 2006_
- '김민경' 작가의 다른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