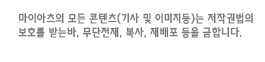- 작품명 :
- 사유의 숲-나무, 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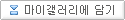
- 작가명 : 금동원, 캔버스 아크릴릭 162.0 x 130.3cm 2007
 작품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작가노트
-
내게 있어 색채는 정신과 사물의 얼굴이고, 기억을 품은 또다른 표현이다.
화면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뛰어 넘어 영화의 데코파주(decoupage)처럼
분절된 형상들이 모여 하나의 화면에 함께 어우러진다.
이때 화면 속 각양의 색채들은 경계를 넘어선 독자적인 형상으로 새로운 개념에 접근한다. 예를 들어 녹색 나무가 아닌 푸른 나무(혹은 붉은 나무)의 형상은
이미 나무가 아닌 내면에 품은 새로운 단편(예를 들어 하늘에 걸린 호수?)이
되기도 하고 공간의 이미지를 넘어선 또다른 형상(예를 들어 심연의 생소한 미지의 이미지가 되기도 한다.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기억의 편린들은 모호한 기호와 형상으로 독특한 조형미를 갖는다. 그렇게 시각적 몽타주(montage)가 된 화면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심미적 표현을 이끌어낸다.
나의 작품에서, 색채는 황홀경이다. 연(緣)이다. 기억이다.
경계를 넘어선 절대적 낯선 표현을 서슴치 않는다.
이는 물체의 또다른 상징과 은유를 이끌어낸다.
그럼에도 나의 그림은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 또한 우주의 하나된 영원성과 결국의 일치성을 증명하는 셈이다.
색채!
감당하지 못할 그 아름다운 유혹은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각적 상으로 재창조한다. 구성과 운율을 이루어내고, 보는 이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감흥을 일으킨다.
색채는 우주이고 마술이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자연이다. 자연의 형상에 오버랩된 색채의 시각적
데코파주(decoupage)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정신적 자유의 상이고 사유의 숲이다. 색채는 꿈이고 유토피아이다.
- 작가 평론
-
글. 박영택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미술평론)
나무와 풀과 바람, 새와 여러 생명체들이 수군대는 소리, 햇살과 안개와 비, 눈 등을 보고 접한 감동과 설레임을 그림문자로 표기하고 기술하는 이 그림은 마치 이야기그림이나 상징언어들로 새롭게 태어난 시와 같다.
자연과 생명체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건져올린, 자기 마음으로 추려놓은 몇 개의 상징기호들을 가지고 마냥 유희하듯 그림을 그린 것이다. 그것은 산과 나무, 새와 물고기, 꽃과 풀, 구름과 비, 모락거리는 열기나 꿈틀거리는 대지, 말랑거리는 생명체들, 다양한 기후와 시간대, 현란한 빛들의 산란이 작가의 눈과 마음에 발자국처럼, 바람처럼 남기고 간 것들에 안타까운 지표화다.
작가는 자연 속에서 자연의 비밀과 신비스러움과 놀라움을 자신의 손으로 거느리고자 한다.
물감과 붓을 들어 보고 느낀 자연을 도상으로 단순화하고 그 벅찬 감동은 색채의 열락으로 만개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구체적인 자연세계의 도상화이면서 동시에 추상이고 기호화다. 모든 상징이나 기호란 실제를 대신해서 그것을 연상시키고 추억하는 대체물로서의 생애를 산다.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처럼 다가오는 것, 기이하고 수상쩍은 그러나 단지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다. 그것이 이미지이고 그림이다.
- '금동원' 작가의 다른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