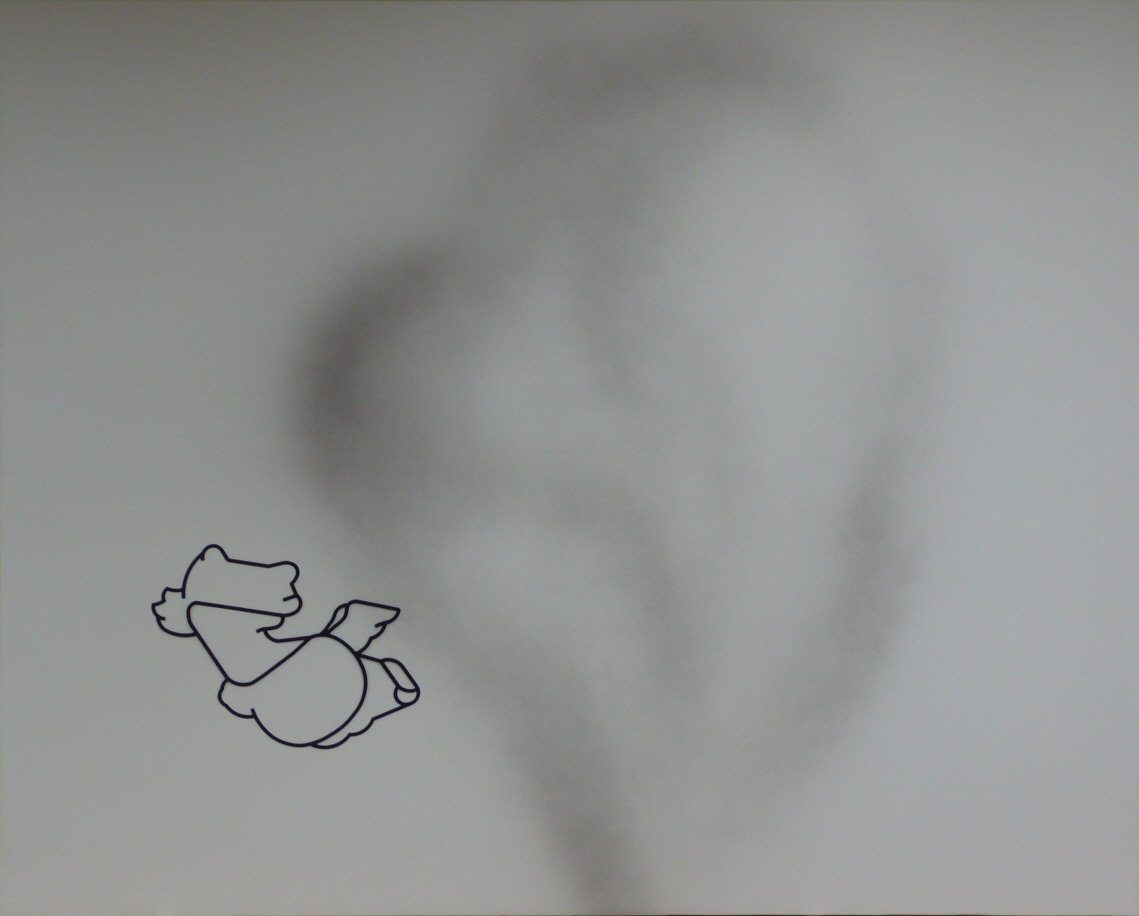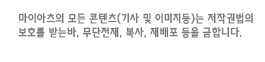오래된 벽 사이로 이뤄진 골목길은 막힌 듯 하지만, 그곳에 긴 시간 누적된 뭔가로 인해 이면의 아득함을 느끼게 해준다. 서있는 곳과 바라보고 느끼는 공간과의 단절되지 않고 서로 순환하는 부분 아니면 그 순간들.
대지와 관계없이 자생하듯 생겨난 건축물, 골목의 적당한 간격과 트임은 여러 시각적 관점을 경험케 한다. 마치 다른 나를 만나는 문 같기도 하다.
오후 5시 이후 공기는 더욱 습기를 머금고 태양빛이 비스듬히 내릴 때면 길 위의 타이어 마찰음이나 먼 하늘의 비행기 소리는 어느 때보다 깊은 곳에서 느껴진다. 현재 대기를 더욱 실감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소리인 듯하다. 대기에 있어왔던 그리고 충격되어온 오랜 이전부터의 사람들이 흘려놓은 시공간이 내게로 좀 더 다가온 듯하다.
대기는 그 자체로도 다가오지만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더욱 실랄하게 다가온다. 그것이 소리이든 냄새이든 기각적인 매체이든.
이 부분에서 본인의 작업도 시작되고 있다. 대면하는 시공간을 은유하는 2차원적인 벽면의 선 드로잉과 3차원적인 입체물을 조응시켜 그 사이에서 생성되는 시공간을 관람자 각자의 소양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가끔 기억인지 현재의 신체가 분비한 생각인지 하나의 시공간이 다가온다.
탱자나무가 잘 정리되어진 골목길.
35년전 그 길을 오가던 여섯 살 아이의 등 뒤에 있는 듯하다. 이러한 시공간은 대기 속에서 남아 있다가 나의 살을 이루듯 다가오는 찰나가 있다.
나를 둘러싼 가족, 지리산 자락, 강의 묵묵한 흐름. 강으로부터 들려왔던 소리, 새의 지남에 따른 대기의 여운 그런 그 당시의 것들이 지금의 나의 등 뒤로 머리 위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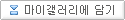
 작품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