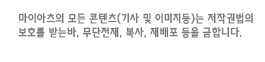- 한성필
- 현실과 이상을 재현하다
- 2009.1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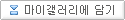
- 인터뷰 날짜 : 2009.07.01
- 인터뷰어 : 나비
- 글 작성자 :
-
공간(空間); 앞뒤 좌우 위아래로 끝이 없는 범위 또는 빈 곳이나 빈자리.
도대체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펼쳐 보이겠다는 것일까. 이미 건물 자체가 상징이 되어버린 건축회사 `공간`의 사옥을 포장한다니,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하여 원서동으로 향했다. 이미 내가 도착하기 전부터 멀리서도 알아 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건축가의 이상이 담긴 도면, 그 이상이 실재로 건축 된 건물, 그 건물의 내부 촬영, 그 이미지가 다시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공간; 사옥의 외벽에 설치된 것. 이 흥미로운 `재현`은 벽에 의해 막혀져 있던 물리적인 공간을 외부로 투과시켰다. 그리하여 2층의 서재, 3층의 작업실이 떡하니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건축전문잡지 공간(space) 의 500호 기념을 위한 의미있는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모호해 지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 가상으로 재현되어 실재공간 속에 공존하고 있었다. 건물의 외관을 보면서도 내부에 존재하는 듯한 착각 혹은 착시를 경험하게 되는 곳. 그곳에서 한성필을 만났다. 이스탄불과 마드리드에서 막 돌아온 터라 힘들 법도 한데 오히려 그는 즐거운 작업이라며 이 실재적인 가상성의 `재현`에 푹 빠져 있었다.

Ground Cloud 040 95 x 80cm Chromogenic Print 2005
그의 이번 작업 역시 ‘파사드(Facade) 프로젝트’의 끊임없는 연장선이다.
런던에서 공부 할 당시, 세인트 폴 대성당의 복원 공사를 위해 실물크기의 성당을 복사해 놓은 포장 이미지를 보고 시작된 파사드 프로젝트. 단순히 이미지였지만 현실을 대체하는 그 상황이 그에게는 인상적이면서도 아찔한 충격이었다. 그 후, 실재(reality)와 이상(ideal) 사이에서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계속 되었다.
한 공간을 촬영하고 그 공간에 사진을 설치하여 다시 사진으로 담아는 과정(전남 도청사 로비에서 진행된 fade in & fade out 작업), 박물관의 모형을 미니어처로 제작하여 이를 다시 사진 속 공간으로 옮겨 놓은 작업(움직이는 박물관) 등은 공간 속의 공간, 사진 속의 사진을 재현하는 방법이었다. 원자력 발전소의 이미지를 담은 ‘Ground Cloud’시리즈, 폐허가 되어 버린 정글의 풍경을 담은 ‘Blue Jungle’(작업을 보면 왜 ‘blue’인지 blue의 이중적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시리즈 등은 각각 프랑스의 시떼(Cite)와 인도네시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작업들이기도하다. 한국에 있는 복제된 자유의 여신상을 찾아서 작업했던 ‘the statue of ...’시리즈가 있는가 하면, 공간이 바뀌어도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존재하는 에펠탑, ‘The eiffel towerS’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미지 자체가 그 피사체를 대체하는 아이콘이 되어 버린 파사드 프로젝트는 결국 오리지널리티와 복제에 관한 문제이다. 원본은 피사체 자체지만 이미지 자체는 재현된 복제인 것이다. 이렇듯 현실계와 이상계를 넘나드는 그의 작업은 여전히 -ing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 찾아 다니기도 하지만 우연히 만날 때도 있다고 한다. 우연히 만났을 경우, 카메라가 없다면? 카메라를 다시 가져와 촬영해야는 고생이 따른다.(참고로 그의 카메라는 20kg가 넘는 중장비들이다.) 버밍엄시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The Beach’ 작업의 경우 다행히 가까운 런던에 카메라를 두고 와서 무사히 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결국 이러한 작업은 그를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여행자로 만들었다.
여행을 가면(설령 일 때문에 가게 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이상은 미술관에서 보낸다는 그. 이번에 스페인에서도 프라도 미술관, 티세 미술관, 소피아 미술관(레니아소피아 국립미술센터)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참 좋았다고 한다. 좋아하는 작가는 고야, 보쉬, 마그리트. 컨셉적인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던져주는 작가들을 좋다고 한다. 코엔 형제처럼 독특한 감독의 영화나 독립영화를 좋아한다는 그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를 추천했다. 영국감독 아시프 카파디아(Asif Kapadia)의 작품으로 북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인간이 극한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까지 되는가에 대한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상상 못할 만큼의 반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던 것은 풍경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 그런 아름다운 북극에서 침몰되가는 인간의 모습이 상당히 뇌리에 남았다고 한다.
그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는 것도 좋아했던 그는 미대 지망생이기도 했지만 언어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독일어를 전공했다. 그러나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의 한계 즉 언어의 모호성들이 있기에 사진의 증언성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시간을 잡아내는 그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15살 때 보았던 바다에 대한 느낌들을 담았던 첫 번째 개인전이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사진인가, 회화인가. 이후 그의 작업들은 이 두 가지 장르의 모호한 경계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회화와 사진 재현의 양면적 역할에 대한 고찰. 사진과 회화, 이미지와 대상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 사이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표현하는 환영이자 꿈인 것이다.

Blue Jungle 09 100 x 80cm Chromogenic Print 2005
인터뷰 이후, 공간500호 출간 기념 ‘순간을 나누다’의 오프닝 파티에 다녀왔다. 당시 공간 사옥 포장 작업은 ‘장소의 기록, 기억의 재현’이라는 전시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그날의 ‘공간’은 새로운 옷을 입었으나 벗은 것과 다름없었다. 굳이 패션으로 따지자면 씨쓰루 룩(see-through look)이라고나 할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외부, 이 얼마나 매력적인 의상인가! 과거의 상상과 현재의 실재가 공존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던 ‘공간’. 이날 ‘공간’에서는 ‘순간’을 나누는 일 밖에는 없는 듯 했다.
“나의 예술은 ‘나’이다. 창작이나 표현이라는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서 가장 솔직한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나에 대한 이야기가 일기일 수도 있고 창작일 수도 있는데 결국 나오는 부분은 자기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이고 자기가 녹아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의 예술은 ‘나’이다가 맞지 않을까.”